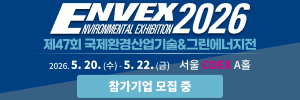[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뿌연 황톳길이 있으면 쭉뻗은 아스팔트 도로가 있다. 한끼 밥값 5000원 짜리 기사식당이 있으니, 커피 한잔값 5000원 짜리가 있다. 한편에서는 살기 위해 먹어야 하지만, 또 한 쪽은 삶을 즐기기 위한 기호로 공존을 맞추고 있다.
같은 하늘 아래 청년 행복주택(9평형)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수십 억원 아파트가 존재한다.
엄연하게 88만원 세대가 존재하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들이 대물림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뒤틀림만 없다면 잘 굴어가는 불가항력적인 '공존'이라고 한다. 거리에는 유기견처럼 여전히 버러지는 양심이 있는가 하면 버러진 것들은 다시 품어주는 곳, 사람들이 더 많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구호가 담긴 현수막이 당당하게 내걸려 있어도 그 밑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숭고한 목숨을 던진 의사의 순국 추모식" 안내 현수막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
공존의 조화는 좌우 대립이나 생존을 위한 생사와 같은 시선에 놓여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 내걸린 두 가지 주제의 현수막은 우리 시대의 공존이 얼마나 절실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존을 깨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선진국이다. 우리나라 공존 수준은 여전히 그들 국가와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그래서 절망과 희망은 반반으로 균형을 잡고 있다.
공존을 잘 풀어내면 '다 함께'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만, 잘못 풀면 얼키고 꼬인다. 공존은 무한한 자유가 부여한 최대의 사치이자. 숙명과도 같은 생물이다.
어떤 형식이나 장르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조화롭게만 유지할 수 있다면 저쪽의 소리도 소중하고 반대편의 소리도 귀중하다.
공존 위에 다른 색을 입히면 반기를 될 수 있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으로 공존을 깨는 것도 사실상 자유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재생산해준다.
공존의 힘은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세상을 돌리고 있어, 각각의 끌림에 따라 강한 매력과 동질감 혹은 배타적인 파괴력을 가져다 준다.
색감이나 공감의 극과 극을 치닫는 현수막이 자칫 언어의 유희 속에 형용할 수 없는 사로잡힘이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굳어질수록 우리 사회는 공존은 쉽게 깨지기 싶다. 늘 위험한 사회다.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리더할 수 있는 사회층이 층층 쌓여갈수록 선진국이였다. 우리의 공존 점수는 몇 점인가.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