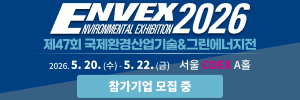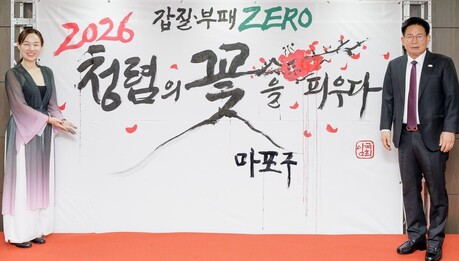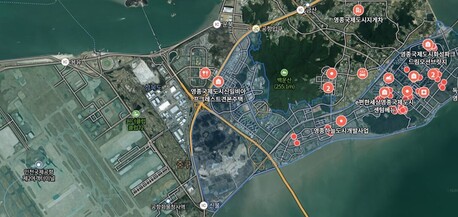한권 책 펴는데 비용 560만원, 그 이상 가치 부여 교육정책필요
서점 서점다워야, 책 많이 읽는 인생 실패할 확률 적다는 진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책에 대한 거부감, 거식증이 늘고 있다.
지하철, 버스, 심지어 걸으면서 까지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간혹 책을 읽고 있으면 불편해지는 분위기다. 책읽는 사람이 초점이 되는 세상이다. 급속도로 스마트폰속에 갇혀 만물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림은 책읽는 것보다 신기함과 재미에 시간을 보내기 딱 제격인 셈이다.
책(독서)을 널리 이롭게 보급해 앞장서 온 언론사들이 앞다퉈 잘하는 일중 하나가, 책소개 고정코너다. 주말판이면 2~3개 지면을 통해 서평 또는 신작 소개에 많은 할애로 나름대로 정성을 쏟는다.
책소개 지면을 펼쳐보고 있노라면, 눈에 들어오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 시대상을 다양한 책으로부터 통해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책에서 세상을 돌아가는 흐름도 읽을 수가 있다. 책은 뉴스이자, 역사이며,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디테일하게 전한다. 정치가 어수선하면 정치관련 서적들이 즐비하고, 빅스포츠가 있으면 해당 관련 서적이 나열된다. 삶이 고단하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투자, 펀드, 우울증치료 등 병주고 약주는 책들도 끼어든다.
책의 세상은 시기에 따라 그때 그때 민감하게 교차한다. 이를 잘 활용해 손에 쥐고 읽노라면, 좀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사회지도층들이 너도나도 휴가지에서 읽는 책, 칩거하면 읽었던 책, 심지어 감옥에서 독파했다는 책들이 일반인들을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정독하고 다 읽었다는 확인할 부분은 없다. 책머리만 읽고 한권을 다 읽었다는 이들도 있다. 책표지만 보고 책을 사는 이상한 버릇의 소유자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언제부터인지 책과 관련된 사회가 한쪽으로 기울려졌다. 그 많던 헌책방들이 사라졌다. 학교주변 그 많던 서점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책이 점점 우리곁에 멀어지는 시대다. 최첨단 디지털 혁명에 종이책은 퇴보해보인다.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라는 질문에 답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미 세상은 책읽기보다 더 현란하고 향락적이며 묘한 마약과 같은 사회의 곳곳에는 책속의 내용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을 멀리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에 충분히 납득이 간다. 책속에 진리가 있다는 명언이 흡집이 난 대목이다. 아무리 책을 홍보해도 책을 소유하는 마력까지 붙잡기에는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두가지 모순으로 치닫고 있다.
독서주간, 책읽기 좋은 계절이라며 책은 권장해보지만, 책읽는 습관보다, 더 다급한 술마시는 일이 많이 생겼고, 커피한잔 마시며 수다를 떨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면 먹방을 유도하는 티브 프로그램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십상도 우리의 모습이다.
국내 출판사들의 마케팅도 문제다. 책한권 펴내는 드는 총 비용은 대략 56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계산법이라면 책 하나 만드는데 소유되는 나무, 탄소배출량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곁뒤 표지를 화려하게 치장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곁치례 비용이 더 소모하고 있다. 다 독자부담이다.
책읽기는 거부하도록 하는 부작용이다. 결국 스스로 비용을 증가시켜, 책값을 올렸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책을 사보지 않게 된다. 언제부터인지, 반환경적인 책제작에 열올리기 시작했다. 화학약물이 더 쓰이는 화려한 곁표지, 두꺼운 종이, 책포장지까지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다.
세계도서박람회에서 해외 출판사들은 유명한 저자의 책 표지나 속지도 용지는 흐리멍텅한 갱지로 제본해 판매하는 것들이 일반화됐다.
이에 반해 우린 아직 반선진국이다(?). 책문화 출판산업도 발상의 전환이 뒤쳐지고 있다. 괜히 3만불, 5만불 운운하는 청사진들이 꼭 황새가 뱁새 흉내내는식에 휘말려 화려한 고가의 책만 만들려는 상술에 독자들이 손길 발길을 돌리는 역효과를 내는 건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젠 현주소를 들춰봐야 한다. 책세상에서조차 겉치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마케팅에서 깨어나야 한다. 책읽는 사람이 없다고, 책읽은 분위기 조성이 안됐다고 호들갑 떠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책값이 싸다. 책은 읽기 편안하고 손에 한 권쯤 들고 다니기에 무겁지 않게 만든 거품없는 배려가 독자들을 붙잡을 수 있다. 베스트셀러의 기본 목적인 널리 보급하는데 엉뚱하게 사재기에 독자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책판매량은 경제와 직결된다. 가난한 나라에서 책이 많이 팔리지 않는 것처럼, 어정쩡한 우리나라 역시, 80년대로 후퇴된 출판의 현실. 하루에 수십여종 책들이 서점에 꽂히지만 왜 책을 읽지 않는걸까. 라는 의문보다는 읽을 만한 책을 기획과 발굴에 아낌없는 지불만이 책 출판산업이 부흥하겠다.
국내 탈북자들이 한국 땅에서 깜짝놀란 풍경중 하나가 대형서점에서 그간 읽어본 적없는 만져보지도 못한 책들이 보물창고처럼 자리한 걸 가장 놀랬다고 한다.
활자는 묘한 힘과 미래를 심어주는 것은 틀림없는 영원불멸하다. 활자가 이마에 붙어 있는 만큼 흥미진진한 책을 멀리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진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다. 종이에 활자가 새겨진 손에 들수 있는 책 자체를 거부하는 청춘들이 많아졌다는 통계도 어둡다.
책읽기 좋은 계절은 따로 없다. 그만큼 요즘은 환경이 좋아졌다. 커피숍을 가도, 야외 공원을, 어딜 가도 책읽기는 안성맞춤의 주변 인프라는 잘 갖춰졌다. 책이란 본디, 손에서 떠나면 이는 한낯 종이뭉치에 불과하다. 건전한 지식 섭취에 해가 되지 않는 책이면 다독을 해도 부족할 판이다.
1959년 한 언론기고문에는 공공도서관에 먼지만 쌓인 책들은 낡은 책의 쓰레기통을 하는 구실밖에 하지 못한다고 그 당시를 꼬집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렸다고 해도, 예나 지금이나 책을 멀리하는 것은 급속도록 좁혀지고 있다.
자성을 해야 한다. 출판업계는 물론 교육계, 정치권에서 조차 책을 멀리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독서, 책을 곁에 두는 습관이 없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선진국 책문화정책에서 습작해야 한다.
안타깝게 대입시험준비에 교과서에만 초점을 맞춘 입시제도에 희생양이 된 학생들만 양산한 우리 교육, 감수성에 예민한 때 책에 질렸으니, 대학을 다녀도 사회에 나와도 책은 장식품, 일년에 단 한권도 사보지 않는 풍토로 자리매김됐다.
또 하나 변질된 초대형 서점이다. 책은 곧 순수한 영혼과 교감하는 나와 1인칭 매개체다. 언제부터인지 상업화에 물들어 책만 파는 공간이, 온통 악세사리, 팬시 선물코너 등 책과 연관이 없는 공간들로 반을 차지했다. 본질이 벗어난 상술에 책을 사기 위해 서점에 가는 것이 아닌 다른 소모품을 사기 위해 책방이 들르는 공간이 됐다.
서점에서 책은 안사고, 엉뚱한 물욕만 채우고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만큼 책이 멸시되고 구경만 하는 현상을 기상세대가 또한번 제공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국회도서관, 학교도서관 마다 곰팡이에 썩어가는 위인전, 세계백화사전 등 세트로 구색을 맞춰진 우리 책문화. 오죽하면 티브에서 책을 대신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다 생길 정도다.
책, 활자만 봐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수밖에 없는 세대가 좀비처럼 확산되고 있다. 책은 세상을 밝고 이롭게 하는 분명한 도구다. 점점 책속에 진리찾기 보다는 엉뚱한 곳에서 불온한 세상과 음흉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순수한 정서를 깨는 장치역할도 역전시킬 것은 역시 책뿐이다. 책을 권하는 사회, 그런 풍토조성을 유명한 아이돌그룹 소녀시대가 책을 읽는 캠페인으로 등장하면 청소년들이 책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책읽기 좋은 계절은 가을이 맞다. 책을 읽도록 책과 함께 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책이 간절하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점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최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무일한 통로라는 사실도 인지시켜줘야 한다.
미국 문학 비평계의 거목 헤럴드 블룸은 독서의 이유, 책을 읽는 궁극적인 이유를 "자신을 튼튼하게 하고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깨닫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책은 많이 읽는 사람을 결코 실패한 인생은 만날 확률이 적다는 깨달음도 반문할 이 아무도 없겠다. <사진제공 베스트맘>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