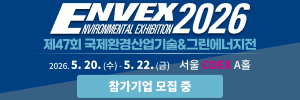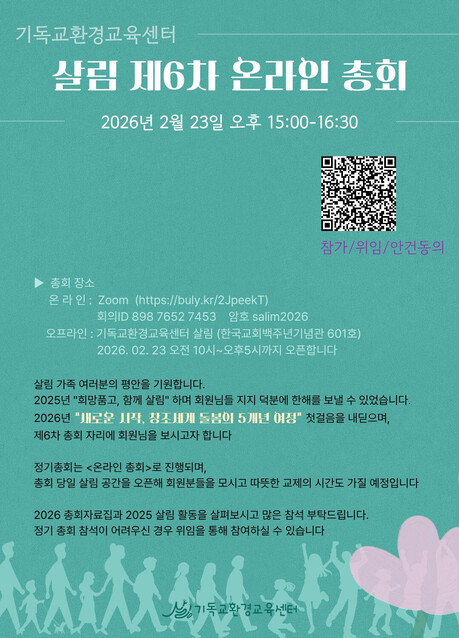| ▲정정식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
[환경데일리 온라인팀]곡식을 직접 먹는 식생활은 고기나 우유를 먹는 식생활에 비해 곡물소비에 큰 차이가 난다. 실제로 쌀로 밥을 지어 먹는 동양의 식생활은 곡물 절약적이지만, 곡물을 가축에게 먹여 고기를 먹는 서양의 식생활은 곡물 낭비적이다. 사실 고기를 먹는 인구의 증가는 식량문제를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 요인에 더 집중해왔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는 식량이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달러를 원조하기도 하고, 또 인구 억제정책과 곡물생산 증대 정책을 도전적으로 펴왔다. 허나 식량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식량문제는 식생활 패턴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서구사회의 육식문화가 식량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사태는 수입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국가의 산업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깨우쳐 주었다. 만약 식량을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식량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항상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 식량을 유지하는 식량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곡식의 자급률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고 밀, 콩, 옥수수 등 나머지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안보가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최근 3개년(2015~2017년) 평균 23%에 그쳤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가축이 먹는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77%가 수입품 이라는 뜻이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서 소비되는 곡물을 자국에서 생산하며 식량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01.5%에 이르렀다. 특히 호주의 곡물 자급률이 289.6%로 가장 높았다. 캐나다는 177.8%, 미국은 125.2%로 북미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곡물 자급률을 기록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비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대해서는 최근 수출국의 수출규제 등에 대비해 품목별로 3, 4개국 정도의 수입국 다변화를 비롯하여 국외 산지의 정보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내 농업생산 증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주요 곡물들의 국내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갈수록 농업환경은 어려워지고만 있다.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인해 농업부문은 앞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업의 가치가 식량 안보를 넘어 자연환경 보전, 식품 안전성, 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이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기본소득 보전, 공익형 직불제도 확대 개편 등을 비롯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26% 정도다.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식량 및 환경문제 연구기관인 월드워치는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국제농업 전문가들도 수년 내 세계적 식량위기가 올 수 있음을 끊임없이 발언해 왔다. 더구나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주곡 자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식량자급률 법제화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은 황해도 국산의 수령으로 있던 시절에 임금께 올린 상소문에서 편농(便農), 후농(厚農), 상농(上農)을 통해 농업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편농은 농민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고, 후농은 농민의 소득이 높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 상농의 의미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농업인의 지위가 높아지고 농사 짓기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