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좌표 제주도와 모빌리티산업과 연결고리
제주도 3다서 5(多)로 탈바꿈, 기후위기 '재촉'
11년 다보스포럼 위상만큼 글로벌 아젠다 쏟아내
국내 첫 실증화단지 등 클러스터 조성 기반 충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 11회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를 마쳤다.
지난 11년을 한결같이 친환경의 좌표가 되는 유네스코 제주도와 모빌리티산업과 연결고리를 찾았다. 안타깝다면 제주도는 생태계의 보고 갈라파고스와 같은 섬과 거리가 먼 길을 가고 있다.
이유는 2023년 기준 각종 수치로 보면 지속가능한 섬이 이어질지 어려운 실정이다. 관광객만 1500만 명이 찾았다. 항공기는 12만7089편이 이착륙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달까지 32만 명을 넘게 입도했다. 중국발 제주행 노선만 16개 노선으로 집중돼 있다. 국제 크루즈선은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313차례 기항했다.
대표적인 먹거리 중 돼지고기 소비는 양면성을 감추고 있다. 양돈산업 발생 비용은 약 1100억 원, 분뇨처리 370억 원, 악취 및 탄소배출 비용 720억 원을 넘겼다.

제주도 인구는 현재 67만3103명, 반면 차량등록 대수 70만 대, 렌트카 대수만 3만 대로 껑충 뛰었다. 사용된 휘발유량 2억1700만 리터, 경유 사용량은 약 4억8400만 리터다.
한라산 골프장은 29곳, 단일 섬중 가장 많고 연간 250만 명이 이용했다. 별 3개 이상 호텔은 3910개를 뛰어 넘었다.
플라스틱 생수병, 1회용컵 사용만 500만 개를 넘기고 있다. 환경세율 예산액(2022년도) 도민 한 사람당 104만7788원, 전국 평균 53만3130원에 비해 2배 가량 많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도민 1인당 하루 2.0kg, 전국 평균 2배다. 제주 전력량만 2023년 기준 600만 메가와트시(MWh)로 육박, 대전광역시 다음으로 높다. 제주지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484만 톤으로 2030년이면 60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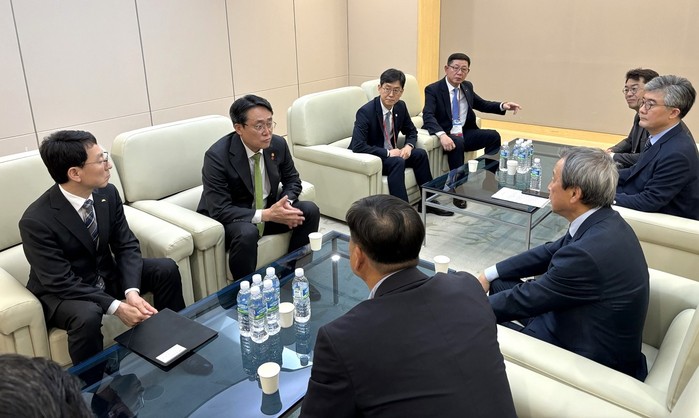


과유불급의 지표로 드러난 건 기후위기로 돌아오고 있다. 1940년대 제주 평균기온 14도에서 2021년 17.5도로 무려 3도까지 도달했다. 섬이 점점 균열(Crack)이 생기기 시작해 가라앉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제주도 3다(多)에서 5(多)로 늘었다. 갇힌 섬에서 늘어난 것들은 생수사용량, 쓰레기양, 소각량, 오폐수 발생량, 에너지소비는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된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 등이 온전할 수가 없다. 이러니 해양생태계를 뒤집히고 있다.제주도내 사용된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 시설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량은 약 7~9%를 머물고 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 근거로 보면 제주도 탄소 배출량은 매년 늘어나 기후위기로 고립의 섬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상이변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물론 비행기, 여객선 결항은 더 잦아서 손실은 것 잡을 수 없게 된다. 농어촌 조업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주목을 끈 대안 중 하나가 e-모빌리티산업의 비전이다. '카본프리 인 제주(Carbon Free in Jeju)'를 지향해온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정신이기도 하다.
올해 행사는 탄소제로화 당위성을 재입증했다. 관광산업을 껑충 뛰어넘는 친환경자동차, 전기선박, 자율주행, 수소전지, 리튬이온배터리, 드론 기술력을 100% 혼신의 힘을 다해 집중시켰다.
국제엑스포는 중앙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업에 큰 힘이 됐다. 다보스포럼 위상만큼 글로벌 콘텐츠로 정책의 아젠다를 쏟아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이 된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갈 길이 멀다. 모빌리티산업은 환경보전분담금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까지 기여할 수 있다.

모빌리티엑스포는 한결같이 고도화된 기술력들이 지향했고 관련산업의 부흥에 힘을 보탰다. 11년 전 탄소 없는 섬(CFI) 구축이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에 러브콜을 보냈다. 가장 제주도 답게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7GW 확대해 발전 비율을 무려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공감했다. 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는 6만 톤 이상을 생산해 2035년까지 3GW의 해상풍력과 수전해 연계성도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모빌리티산업 나아갈 지침은 분명하다. 화석연료와의 종식을 위한 법적 장벽도 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대기 환경보전법까지도 규제완화로 손봐야 한다. 그 하나가 대안이 제주도형 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다.
제주도 최종에너지소비량은 100만 톤(toe) 이하로 낮출 탈 것의 모든 이동수단인 100% e-모빌리티산업 대전환을 성큼 앞당길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제주도는 e-모빌리티산업화 '조례' 발의와 함께 특별법에 전폭 지지가 필요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온실가스감축목표 실현의 징검다리인 전기선박 특구 조성에 긍정적인 입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도형 e-모빌리티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공공 및 민간 공동 참여하는 에코프런티어 공감대 형성이다. e-모빌리티산업 집약체인 드론을 비롯해, 자율주행, UAM, 배터리, 선박, AI로봇, 농기계전동화, 관련 부품소재가 하나의 종합세트로 이뤄져야 한다.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전국 특성화대학과 협업하고 제주도에 실증화연구단지, 테스트베드 국내 최초 클러스터화가 뒷받침돼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은 치열한 치킨 게임(chicken game)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자칫 e-모빌리티산업조차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협 2050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주민 참여형으로 규제없는 전기차 충전특구, 드론 서비스특구, 스마트시티 챌린지 구성은 국가경제의 큰 축"이라면서 "2030년까지 75% 전기차 보급률을 기대하고 EV 배터리 산업화 체질을 위해 e-모빌리티 허브(Mobility Hub)는 불가피한 필수"라고 했다.
김대환 세계EV협의회(GEAN) 회장 역시 "지난 10년은 척박한 제주도에서 전기차의 중요성에 시동을 결코 우연히 아니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탄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패러다임처럼 전문인력을 키워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호소했다.
2024년도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 현장은 잠재력을 일깨웠고 동시에 한국형 e-모빌리티산업이 충분히 씨앗들이 심었다. 이제 결실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 됐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