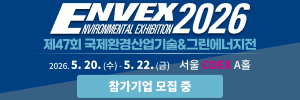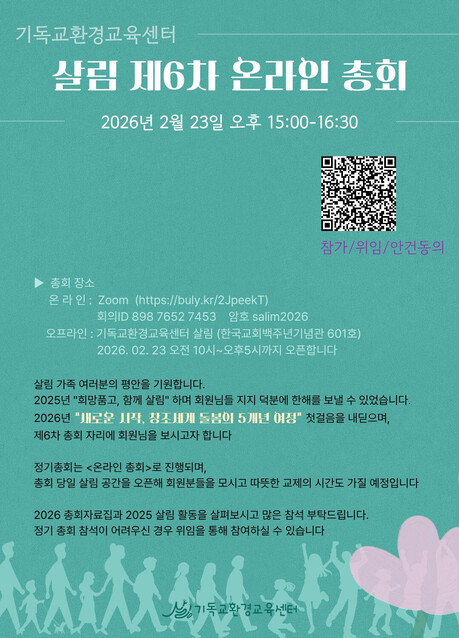계획따라 314개 관측소 구축해도 82개 추가 설치해야
147억원 낭비 우려, 유관 관측소 활용 153억 원 절약
유관 관측소 활용 조밀도 향상 관측소요시간 2초 줄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 땅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될 지진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곳에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라 지진관측소 문제를 조사했다 .
기상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9년 4월22일 지자연과 체결한 '국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설계 및 실시간 지진자료 공유기반 연구'용역계약의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진관측(최소 6개 이상 관측소에서 지진감지)에 소요되는 시간을 5초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관측소 간 간격을 18~20km로 해야 하고 격자망 형태로 구성된 관측소 총 314개가 필요하다.
 |
| ▲2017년 10월 16일 15시 51분 15초에 2.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발생위치는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6km 지역(35.79 N, 129.19 E), 지진 발생깊이는 14 km이라고 기상청을 밝혔다. |
이를 근거로 기상청은 2010년 7월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운용 중인 150개의 (기상청 110개, 유관기관 40개) 지진관측소 외에 154개의 관측소를 신설을 계획했다.
그러나 기상청 조밀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2년간(17~18년) 108개소의 관측소를 신설, 총 314개의 관측소를 구축하더라도 국내 면적 약 20%에서 관측공백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럴 경우, 목표 관측 소요시간인 5초에 비해 약 1초의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따르면 관측 공백이 예상되는 해당 20% 면적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82개의 관측소(설치비 147억 원)를 추가신설 해야 한다.
또한 2017년도 지진관측소 신설예정지 31곳이 중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51억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또 기존 182개 지진관측소를 운영하면서, 일부 지진관측소의 지진미탐지율이 90%를 초과하는 등 전체 지진관측소의 지진미탐지율이 44%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기상청에서 별다른 관측환경 조사나 별도의 개선조치는 없었으며, 연한이 지난 장비의 교체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등 7개의 유관기관에서 16년 12월 기준, 290개의 관측소를 운영(향후 신설계획 포함 시 399개)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계획 수립 당시에 92개의 관측소를 운영 중이었다. 그럼에도 기상청은 유관기관 운영 관측소 중 50개 정도만 지진관측망에 활용하고 있다.
기상청이 활용하지 않는 중인 유관기관 기존 관측소를 개선해 활용하는 경우, 인구밀집지역(서울·대전·광주·부산), 지진다발지역(양산단층대) 및 원자력발전소(월성·고리·영광·울진) 밀집 지역의 관측 조밀도가 개선된다.
여기에 향후 신설 예정인 관측소까지 활용하면 신규 관측소 설치 수요가 190개소에서 85개소를 줄인 105개소가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경우 설치비 약 153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유관기관 관측소를 전부 지진조기경보에 활용할 경우, 기상청 관측망 종합계획에 비해 평균 이격거리가 12.4km로, 조밀도가 크게 향상돼 관측소요시간은 3.4초까지 절감할 수 있다.
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관측소는 배경잡음이나 장비이상으로 당장은 곤란하더라도, 관측환경이나 장비상태를 개선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본다."며 "관측소를 많이 짓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기상청에서 유관기관 관측소 활용과 같은 대안을 고민해 준다면, 지진관측의 정확도가 늘 것이다. 이는 결국 기상청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불안 감소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