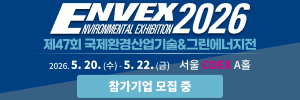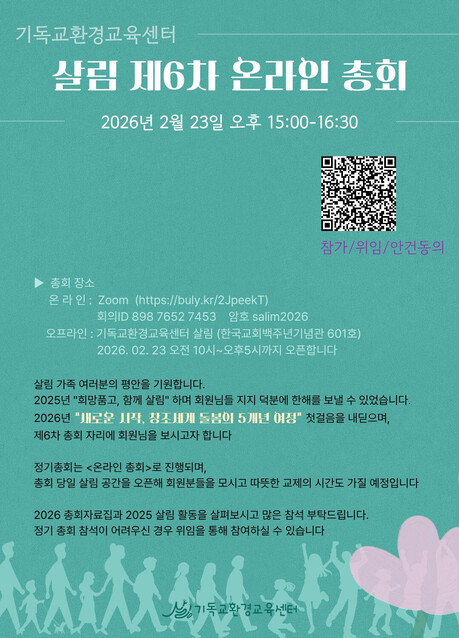가장 많은 정착 경북 2323, 전남 1923, 경남 1631가구
역귀농 원인, 문화적 차이, 도시생활보다 수익 부족 탓
중앙정부, 지방분권 강화되면 귀농 예산 및 희망자 늘것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탈 서울, 경기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역귀농하는 인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도시민에서 농민이 되고, 어민이 되고, 산촌인이 되는 속칭 귀농가구의 규모는 1만2875가구로 전년 대비 1만1959가구 보다 916가구(7.7%)가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통계청이 2016년 귀농인 통계에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가장 많이 정착한 곳으로는 경북도에 2323가구(18.0%)로 가장 많다. 이어서 전남 지역에 1923가구, 경남도는 1631가구) 등의 순이다.
가구당 평균 귀농가구원수는 1.60명으로 전년(1.66명)보다 0.06명이 감소했다. 이같은 수치는 대부분 부부만 귀농했다는 증거다. 귀농가구주 성별 및 연령은 남자가 67.8%이고 평균 연령은 54.2세로 전년(54.0세) 보다 0.2세 높아졌으며 50∼60대가 65.3%를 차지했다.
국가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명예퇴직자가 늘었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아예 도시에서 정착보단 귀농을 택했다는 점이다. 전년 대비 구성비는 30대 이하와 60대에서 0.8%p(190명), 1.0%p(349명) 각각 증가했다. 귀농가구의 구성은 1인가구가 8276가구로 64.3%를 차지하고 독립가구는 85.6%, 귀농지역 거주민과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혼합가구는 14.4%이다.
귀농가구원의 규모는 2만559명으로 전년(1만9860명) 보다 699명(3.5%)이 증가했다. 귀농인은 1만3019명으로 전년보다 905명(7.5%) 증가했고, 동반가구원은 7540명으로 전년보다 206명(2.7%)이 감소했다. 특히 중요한 귀농인 중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9451명(72.6%)이고 다른 직업을 보유한 겸업 귀농인은 3568명(27.4%)에 달했다.
작물재배가구(7800가구)의 평균 재배면적은 0.40ha(4,021㎡)이고 주요 작물은 채소(40.8%), 과수(31.2%) 등의 순이다. 자가 소유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 자경가구는 64.9%이고 일부라도 타인 농지를 임차해 작물을 재배하는 임차가구는 35.1%이다.
지리산자연밥상 3,8점방 고영문 대표는 "귀농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사전에 충분한 지식습득과 함께 계획을 가지고 정착을 꿈꾸며 도시생활보다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오히려 자유롭게 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면서 "다만 도시생활에 몸에 벤 습성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 않겠지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농촌과 도시로 연결할 일감을 찾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귀촌가구의 규모는 32만2508가구로 전년(31만7409가구)보다 5099가구(1.6%)가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8만5441가구(26.5%)로 가장 많고, 경남(3만7732가구), 경북(3만7261가구) 등의 순이다. 가구당 평균 귀촌인수는 1.47명으로 최근 3년간 동일했다. 귀촌가구주 성별 및 연령의 경우 남자가 62.0%이고 평균 연령은 44.5세로 전년(44.1세) 보다 0.4세 높아졌으며, 30대 26.4%, 40대 19.4% 등의 순이다.
귀촌가구의 구성은 1인 가구가 225,645가구로 70.0%를 차지하고 독립가구는 67.8%, 귀촌지역 거주민과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혼합가구는 32.2%이다. 귀촌인이 4만75489명으로 전년보다 8711명(1.9%) 증가하였고 동반가구원은 15만2981명으로 3612명(2.4%)이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40.6세로 전년(40.3세)보다 0.3세 높아졌고, 20대 이하가 26.3%, 30대 24.9%, 40대 17.0% 등의 순이다.
귀촌 전 거주지역의 경우 경기가 11만2472명(23.7%)으로 가장 많고 서울 7만1619명(15.1%), 경남 3만9064명(8.2%) 등의 순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귀어가구는 929가구로 전년(991가구) 보다 62가구(△6.3%)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345가구(37.1%)로 가장 많고, 충남(286가구), 경남(83가구) 등의 순이다. 가구당 평균 귀어가구원수는 1.44명으로 전년(1.46명) 보다 0.02명이 감소했다. 귀어가구주 성별 및 연령의 경우 남자가 71.6%이고, 평균연령은 51.2세로 전년(50.1세) 보다 1.1세 높아졌으며, 40∼50대가 56.1%를 차지했다.
귀어가구는 1인가구가 682가구로 73.4%를 차지하고 독립가구는 70.2%, 귀어지역의 거주민과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혼합가구는 29.8%다. 귀어가구원은 1338명으로 전년(1446명)보다 108명(△7.5%)이 감소했다. 귀어인은 1005명으로 전년보다 68명(△6.3%) 감소했고 동반가구원은 333명으로 전년보다 40명(△10.7%)이 감소했다.
귀어인 중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743명(73.9%)이고 다른 직업을 보유한 겸업 귀어인은 262명(26.1%)이다. 귀어 전 거주지역의 경우 경기가 240명(23.9%)으로 가장 많고, 서울 158명(15.7%), 인천 129명(12.8%), 전남 120명(11.9%) 등의 순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이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농림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김귀영 센터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실패없도록 충분하게 지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꿈꾸던 귀농인구 전체중 30% 정도는 5년 뒤에 역(逆)귀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농에 실패한 원인으로 농촌사회 정착, 생각보다 도시보다 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박재완 의원은 올 4월 귀농촌 정책 대전환을 전북도에 강력 촉구한 자리에서 "소멸 위기에 몰린 지자체 입장에서 귀농촌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그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는 말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역귀농 현상에 대한 막대한 재정투자가 무색케 도시로 떠나는 건 정책적 실패라며 2010년부터 12년까지 도내 역귀농자는 365가구 7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전체 귀농자 10가구 중 1가구 가량이 되돌아간다. 이는 역귀농이 매년 급증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귀농촌자 유치 정책는 실효성이 없어 앞으로의 귀농촌 정책은 당사자들이 환상으로부터 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더불어 잘 터잡고 살아갈 수 있게 정착지원분야에 강화해야 실패가 없다."고 주장했다.
귀농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거버넌스 취약이다.
농림부가 확보한 2017년 귀농정책 예산은 겨우 146억원 뿐이다. 이 지원금으로 지자체에 나눠주는 건 가뭄에 콩나는 식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정책 관계자는 "역귀농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농지은행 통해서 지원해주고, aT센터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보조해주고 있다."면서 "지난해보다 귀농지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도별로 전국 8곳에서 운영되는 체류형 귀농지원센터 운영이 끝나지만, 도시 청년들을 상대로 예산 확보에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예산부족도 문제지만 재정당국(기획재정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이를 해결해줄 필요가 있고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은퇴자 대상으로 귀농(창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귀농 관련 정부예산 편성은 한계가 있지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집권화에서 벗어난다면 귀농정책은 오히려 희망적이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