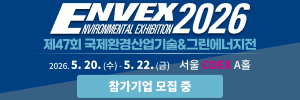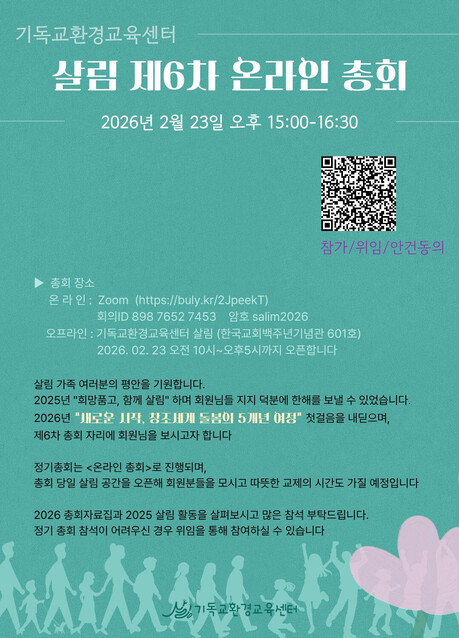[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매화다. 매화 '꽃'이다. 4월에 유채꽃이 뭍으로 채 오르기 전에 산수유가 날세게 가로챈다. 날찬 제비가 곧 돌아오는 기세다.
도시에 갇혀 있던, 문틈에 겨우내 시커멓게 쌓인 먼지를 씻어 내기 매화꽃은 베란다를 타고 올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린다.
매화꽃은 어른 아이 처녀 총각 모두를 출렁거리는 딱 뜨인 바다로, 높은 산정상으로, 나즈막한 들녘으로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샘하기에 "딱 좋아라."
매화꽃 사랑은 잊을 만하면 어느 봄날, 누런 책갈피에 압화된 채 다시 핀다. 그는 말없이 떠났지만, 향기없는 매화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니다.
똑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비슷한 색채의 아파트 단지내 홀로 핀 매화꽃 한 그루는 온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충분하다.
밤하늘 별빛이 매화꽃을 쳐다 볼 때, 우리 어머니 어깨에 살포시 내려 앉는 봄날이다.
"부르고 싶어져라." 내 어머니는 한떨기 '매화'였으니, 세월이 한참 흘러 흘러도 가슴이 아려오듯 그리운 것 옆집 앞집 모두가 같다.
매화꽃이 필때면, 치마폭 휘날리며 까르르 웃으며 꽃길만을 걷어가는 우리 젊음이들이 매화꽃이구나.
꽃이 언제 사람에게 등을 돌리더냐, 비가 오면 오는데로 받고,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춤을 추거늘, 늘 사람들 탐심이 꽃을 꺾고, 꽃잎을 치더라.
매화꽃이 올라오면 목련과 함께 개나리가 줄을 서고, 철쪽이 웃고, 장미와 라일락꽃, 꽃다지가 우리에게 손짓하며 마중나오리다.
모두 행복하자. 이 봄날에 볕드는 날 모두 손잡고 걷고 걸어보자. 눈물이 나오는 것도 행복하리라.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