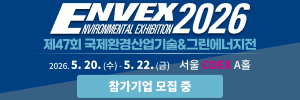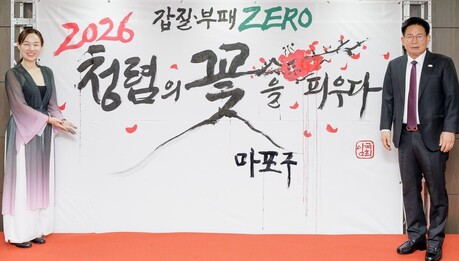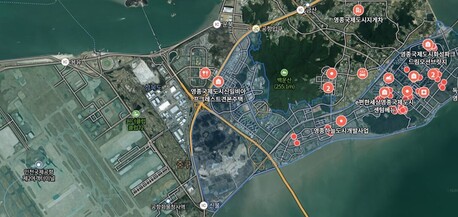에너지효율 및 자연환경 저해, 기온 상승 효과 기술한계성 드러나
초고층의 역습, 시인 외침 옳아 초고층 건축물 또 하나의 십자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가상의 공간을 연출하는 SF영화의 대명사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보면 초고층 건축물들이 즐비하고 하늘을 나르는 소형비행기들이 미래에 대한 자극하기 충분하다.
영화속에서 사이언스적인 접근에서 보는 주거공간은 가히 상상이상의 공간이지만 반면 스크린에 비춰진 자연풍광은 온전하게 있는 소재의 영화는 없다. 최근 히트를 친 인터스텔라에서 자연황폐화,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는 멈춘 지구로 등장한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초고층 건축물의 역습이 씁쓸하기 그지 없다. 땅, 흙을 밟을 수 없는 붕 떠 있는 공간의 100층이 넘는 인공 구조물이 최고다. 멋지다. 제값을 한다. 부의 상징이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간혹 세입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굳이 이런 최첨단 주거시스템으로 24시간 감시받는 공간에서 사는 우리의 행복지수는 얼마쯤 올라있는지 생각케 된다. 땅이 좁은 나라에서 최상의 선택이 어디를 가도 아파트 단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초고층 주거빌딩을 지어야 직성이 풀리는 건설업계의 이상한 심리까지 더해진 우리 건축문화다.
이런 초고층 건물에는 분양가에 포함된 고가의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적 요소중 열병합 발전설비, 지열, 제어 환기, 폐수열 회수, 대기전력차단시스템 등이 적용된다고 자랑하고 있다. 초고층 빌딩답게 당연하게 설치돼야 할 쓰레기 및 음식물류쓰레기 자동이송설비, 단지 내 태양광 활용 기술이 도입된다고 자랑하듯 분양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도 첨단 시스템이라고, 넘치면 모자람 만 못한다고 했다. 초고층 주거빌딩 설계에는 얼마큼 친자연적인 공간을 꾸몄는지 보지 않아도 알수 있다. 독한 사람만 견딜 수 있을지언정 야생동물은 일주일을 버티기 힘든 구조물이다.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은 무한한 무한정적인 것처럼 착각의 시대에 깊숙이 빠져있다. 넘치는 자동차로 인해 극단적인 피해가 터진 것처럼 철철 넘칠 것 같은 에너지의 고갈위기,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초고층건물들 반환경성, 이와 공조한 허세와 허영의 틈바구니에 또 다른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춰지고 있다.
최소한 환경훼손이 없는 축복을 갈구하는 기도에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조물주의 식어버린 열정을 탓하기 보단, 경제적 가치만 운운하다보니 사람들의 본성과 근본까지 외면한 채 만용으로 덧칠해져 도시는 황폐화된 누더기 옷을 갈아입고 있다.
초고층 빌딩들이 길게 잡아 50년이후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리모델링할 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일단 땅으로 부터 더 멀리, 더 높이 올리는 경주만 하고 있다.
통유리 겉치장과 달리 속을 들려다보면 화려하지만 매우 매말라 척박하다. 마치 네온사인으로 만든 붉은 십자가 위 피뢰침, 그 위에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국민들이 아니였다는 어느 시인의 외침이 옳음을 해운대 초고층 건축물이 또 하나의 십자가가 되고 있다.
초고층의 역습, 기사에는 다 담지 못했을 터 우리가 좇는 표본화되는 적나라함과 한마디로 합종(合從)과 연횡(連橫)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초고층 빌딩안과 밖이 공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의 사회적 갈등 유도 매개체로 균열이 보인 셈이다.
부의 상징물 초고층에 사는 이들의 측은감보다는 개발논리에 희생양이 아닌가 짚어본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괄호안에 갇혔다. 그 괄호안에 선이 넘지 못할 만큼 비대해졌고 뚫고 비집고 들어간 공간조차 없는 것도 당연시됐다. 호감과 기대가 저물였던 지난 수십여년의 격동의 사회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기원전 600년경 바벨탑, 그로부터 수천년이 지난 지금 초고층 건물속에 갇혀 던져진 메시지는 확고하다. 풍족한 기술이 넘치니, 영원불멸할 것처럼 다 채워질 듯 착각에 빠졌다. 건축주들의 농간에, 분양가를 치솟케 하고 초고층 건물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를 숭배한 세입자들의 허상이 우르르 무너지고 있다. 통유리에 갇혔으니, 새장에 갇힌 것 보다 더 초라하고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스친다.
현해탄에서 밀려오는 해풍과 지구 밖 태양의 열기쯤은 현존의 건축기술력으로 완벽 차단할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했다. 현실은 정반대.
막상 살아보니 매일 쳐다보는 바다 그리 아름답지 않을 터, 한 예로 집 앞 지척에 있는 호수공원을 가지 않는 것처럼, 서울 사람들이 남산에 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에어컨을 틀어야 살수 있고, 한 겨울에는 더 추워서 난냉방을 번갈아 틀어야 버틸 수 있다니, 흙을 멀리한 우리에게 자연은 어떤 보답을 되돌려줄 지 극악 무도한 괴물 초고층 빌딩이 보여주고 있다.
통배짱이라면 에너지 과소비에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 시대의 개발론자들, 입주자들이 한달 관리비로 200만원은 내고 살아야 제대로된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집이 상전이 됐다. 비견한 예로 곧 다가온 한파 서민들에게 던져준 에너지바우처가 왜 이리 부끄러운가. 이를 개발이라는 깃발아래, 이 시대의 일그러진 반사경(反射鏡)이 초고층으로 비춰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 영국의 경제 석학 황이핑, 찰스 굿하트 교수는 주장이 이채롭다. 과도기, 거듭 반복된 과도기에 도는 넘는 경제론의 불균형 부작용이 건물에서부터 기본 윤리가 깨졌다며 주장했다. 또한 깨지도록 만든 진원지는 정부와 대기업의 방관과 공조라고 꼬집었다. 유독 집에 한이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셈이다.
한발 앞서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자연회복성 노력을 등한시한 산업은 곧 멸종한다고 했다. 맞다. 영락없이 대기업와 정부만 비대해지니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낳은 것처럼. 그 몰락이 직장을 깨고, 가정을 깨고, 인생을 깨고 추락을 반복하는 먹이사슬이 됐다.
환경을 더 소중하게 하는 환경공동체주의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땅이 좁다고 무조건 초고층 건축물이 대안이라는 발상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SF무비와 달리 자연재해를 이길 그 어떤 과학적인 테크롤로지는 없다. 다만 위안이 된다면 초고층 건물로 인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자연을 소외시키고 극심하게 치닫기만 해온 건설산업화의 왜곡이 친자연주의 건설산업으로 전환할 새로운 공존 노력이 필요하다.
포근한 꽃밭이 있고 강아지를 키우며 사계절 바람과 비와 햇살,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단독주택은 너무 멀리가 버렸다.
저 남녘 부산 해운대 초고층 건축물을 말한다. '자연으로부터 신뢰의 상실'의 흑막을 거둘 두 얼굴의 인공구조물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 위태로운 공간을 제자리로 회복할 친자연주의 힘이 더 간절하고 필요하다고,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